실리콘밸리를 놀라게 한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중국어 이름은 무엇일까? 바로 ‘깊이 있는 탐색深度求索’이다. 정보를 찾고 답을 내는 AI에 붙인 이름치고는 꽤 낭만적이다. 더 흥미로운 건 이 이름이 고대 시 ‘이소離騷’의 구절, ‘길이 멀고 험해도 나는 위아래로 탐색하리라路漫漫其修遠兮, 吾將上下而求索’를 연상시킨다는 사실이다. 초나라 충신 굴원屈原은 이 시에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원대한 목표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된 충신, 딥시크는 처음부터 국가에 그런 존재가 되고자 한 것이 아닐까?
딥시크라는 충신忠臣
딥시크는 실제로 구국救國의 공功을 세웠다. 미중 기술 경쟁에서 수세에 몰린 중국이 딥시크라는 날카로운 칼로 미국의 허를 찔렀기 때문이다. 딥시크가 미국 빅테크의 AI에 맞먹는 성능을 지닌 모델 ‘R1’을 공개한 날은 2025년 1월 20일. 공교롭게도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압도적 AI 패권’을 외치던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딥시크의 이름은 미국의 개발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급속히 퍼졌고 1월 27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루 만에 17% 폭락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2배를 넘는 5,890억 달러약 843조4,400억 원가 딥시크의 등장과 함께 증발한 것이다.
딥시크는 그렇게 미중 기술 경쟁의 새 막을 열었다. 중국의 AI가 세계적으로 ‘딥Deep 임팩트’를 일으킨 이유는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보잘것없던 항저우의 한 스타트업이 미국의 대對중국 기술 봉쇄를 뚫고 미중 경쟁의 핵심 전장에서 중국의 지위를 끌어올렸다.’ 화웨이(5G), 틱톡(소셜 미디어), DJI(드론), CATL(배터리), BYD(전기차)에 이어 중국은 마침내 AI 분야에서 선도 기업을 갖게 된 것이다. 딥시크 스토리는 중국 입장에선 통쾌한 승전보지만, 미국과 깊은 동맹을 맺은 동시에 중국과 기술 경쟁을 벌이는 우리나라에는 경종 그 이상의 공포다.

철鐵로 만든 금관
딥시크의 AI 모델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전방위 기술 봉쇄 속에서도 고성능 AI를 개발해냈다는 점이다. 기술 장벽을 뚫는 과정에서 성능은 높고 가격은 낮은 ‘괴물 AI’가 탄생했다. 실제로 AI 성능을 비교하는 지표 중 하나인 ‘미국 수학경시대회AIME 풀이 정확도’ 테스트에서 딥시크의 R1은 79.8%의 정확도를 기록해, 79.2%를 기록한 오픈AI의 최신 모델을 앞섰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벤치마크 평가에서도 딥시크의 모델은 총 21개 분야 중 정답이 명확히 정해진 12개 항목에서 오픈AI와 구글의 모델을 능가했다.
미국의 제재로 고가의 AI 전용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한 딥시크는 개발 원가 측면에서도 혁신적 성과를 보였다. 딥시크가 공개한 기술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사의 최신 모델 ‘V3’ 훈련에 들인 비용은 557만6,000달러약 82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GPT-4 개발 추정 비용의 18분의 1, 메타 LLaMA3의 10분의 1 수준이다.
중국에서는 딥시크를 두고 ‘철로 금관을 만든 격’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그리 과한 표현만은 아니다. 이들이 활용한 ‘연금술’은 AI 모델 훈련 과정을 단순화하고, 반도체 자원을 극대화하는 기술 전략으로 요약된다.
딥시크는 훈련 방식, 모델 구조, 작동 기법 등 전 영역에서 기존 빅테크와 차별화된 기술적 혁신을 이뤄냈다. 무엇보다 딥시크는 인터넷 시대의 기존 경쟁 구도인 ‘중국은 폐쇄, 미국은 개방’을 뒤집었다. 오픈AI가 비공개Closed 모델을 내놓는 것과 달리, 딥시크는 완전한 오픈 소스 전략을 택했다. 오픈 소스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수정·배포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발자들이 기능을 직접 검증하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다.
창업자 량원펑의 인재 영입과 경영 방식도 파격적이었다. 그는 중국 1위 퀀트 펀드 운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아낌없이 투자해 뛰어난 인재를 영입했고, 단기 실적보다 ‘오픈AI와의 기술 격차 해소’, ‘인간 수준의 범용AIAGI 개발’ 같은 장기 비전을 회사의 핵심 목표로 삼았다. 그는 2024년 7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범용 AI를 실현하는 것이다. 현재로선 명확한 해답이 보이지 않지만, 대기업이라도 절대적 우위를 가진 것은 아니다.”
판도가 바뀐 미중 AI 경쟁
미국 대 중국의 거대한 기술 경쟁은 딥시크의 등장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중국은 2017년 인공지능을 핵심 국가 기술로 지정했지만, 이듬해부터 시작된 미국의 전방위 대중국 기술 봉쇄 속에서 돌파구를 좀처럼 찾지 못했다.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세월 동안 중국이 주력한 일이 바로 전 국민을 동원한 첨단 기술 인프라 구축과 인재 육성이었다. 결국 2023년 미국의 반도체 장비 규제를 뚫고 구형 장비로 화웨이와 SMIC의 7나노 칩을 양산하는데 성공했고, 2024년에는 CXMT의 DDR5 개발을 통해 고사양 반도체의 국산화에도 일부 성과를 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딥시크의 R1이 등장했다.
이제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AI 경쟁’이란 링 위에 올랐다. 이는 중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에 필적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지금부터는 하드웨어의 미국 vs 소프트웨어의 중국, 민간 기업 주도 경제 vs 국가 주도 경제, 자유주의 사회 vs 전체주의 사회, 글로벌 인재 풀 vs 중국식 천재 군단이 정면으로 맞붙게 된다.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개발도상국를 ‘딥시크 영향권’으로 삼게 될 경우, 미국에 맞서는 새로운 첨단 기술 진영이 구축될지도 모른다.

지울 수 없는 안보 우려
딥시크가 혁신을 이룬 것과 별개로 우리에게는 불편한 존재임이 틀림없다. ‘딥시크 차단’ 조치도 빠르게 이뤄졌는데, 이는 딥시크의 데이터 수집이 일반적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중국 서버에 정보 저장, 정보 수집 동의 절차 생략이다. 특히 딥시크는 한동안 사용자 키보드 입력 패턴Keystroke Patterns 등 이른바 ‘디지털 지문’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했으며, 이 데이터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에 전송하면서도 사용자에게 이를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더구나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모두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된다. 중국 법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업에 데이터를 요청할 경우 즉각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딥시크의 기술력과 별개로, 보안과 정보 주권 측면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딥시크에 대한 감정적 거부감이 AI 기술 연구나 중국 기술 동향 추적을 위축시키는 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은 더 냉정하고 철저하게 이 기술의 전개 양상을 분석해야 할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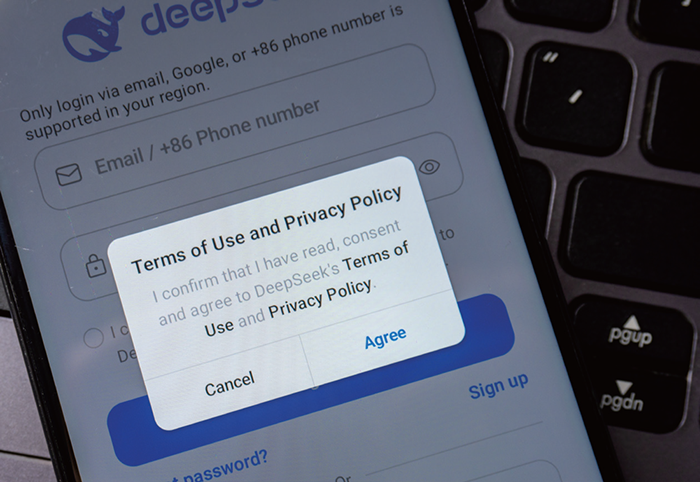
미국과 분리된 세계가 온다
중국은 딥시크의 괄목할 성공을 발판 삼아 미국과 분리된 새로운 기술 질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추격자’가 아닌 ‘개척자’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다양한 기술 산업에서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 표준’을 확대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중국의 베이더우중국의 위성항법 시스템와 미국의 GPS, 중국의 톈궁우주정거장과 미국의 ISS, 중국의 위챗페이모바일 결제와 미국의 비자 카드 등에서 양국의 기술 체계는 점점 분절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에는 중국 주도 진영과 미국 중심 세계가 서로 다른 기술 개발·적용·활용의 규칙을 갖는 구조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각국은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를 ‘미국 버전’과 ‘중국 버전’으로 나누어 공급해야 하는 이중 체제Double Stack 시대를 직면할 수도 있다.
글. 이벌찬(조선일보 베이징 특파원, <딥시크 딥쇼크> 저자)

_2025071818095919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