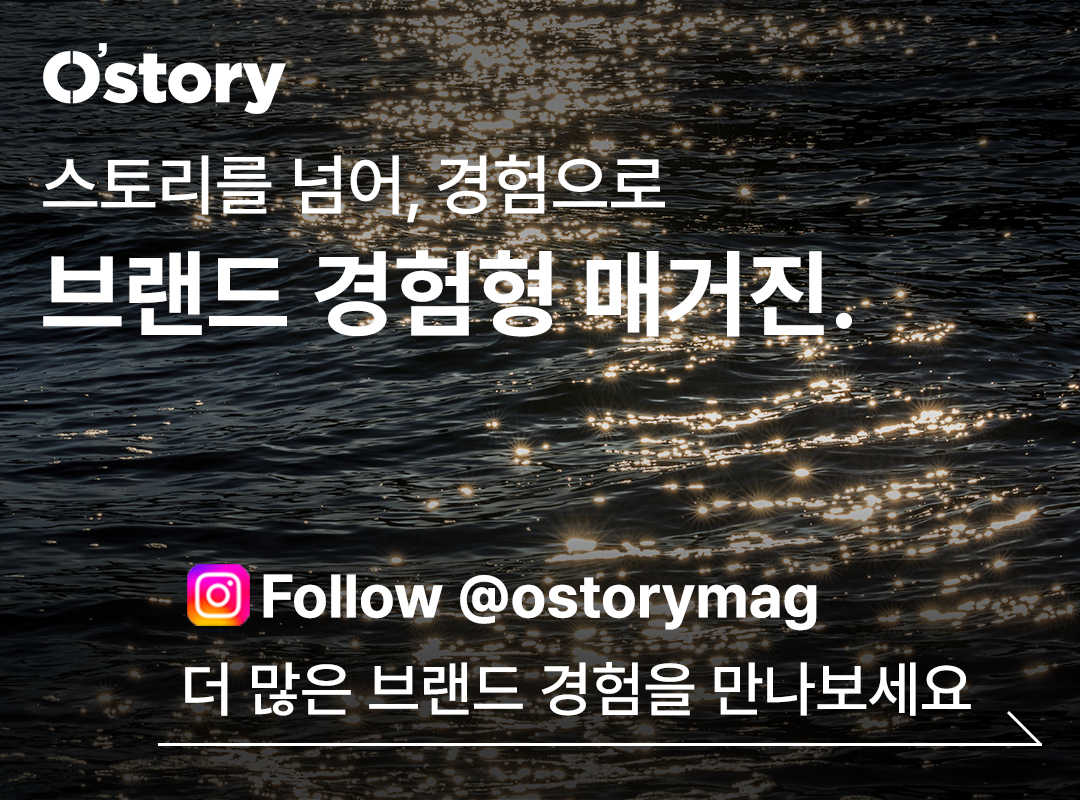K뷰티 '한 여름 밤의 꿈'과 같던 중국 시장을 바라보며

현재 K 뷰티는 한국의 주요 4대 소비재 수출 품목으로 지정될 만큼 해외 시장에서의 높은 인기와 수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92억 달러를 기록하며 약 10조 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한 K 뷰티는 2022년 80억 달러로 주춤하였지만 올해 다시 98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전체 수출액은 주춤하였지만 일본 내 수입 화장품 국가에서 최초로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고 K-콘텐츠 인기를 타고 베트남, 대만, 태국 등 동남아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듯 K 뷰티의 대내외 시장 환경 속에서 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 부진의 터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시장이 있으니 바로 중국 시장이다. 중국 시장은 2022년 기준 전체 수출액의 약 45.4%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전년 대비 26% 줄어들며 수출국 2,3위인 미국(-0.2%), 일본(-4.9%)에 비해 눈에 띄게 하락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수출액 하락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국 내 로컬 브랜드의 성장과
신애국주의로 통하는 궈차오(国朝)
사이에서 K 뷰티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
5월 1일 조선비즈에 올라온 '[김남희의 차이나 트렌드] 설화수만 남기고 싹 접은 아모레, K 뷰티 관심 없는 中, 뭘 쓰길래'의 칼럼을 읽어보면 중국 내 K 뷰티 어려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 화장품 BIG 3 중 한 곳인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현재 중국 시장에서 설화수 정도를 제외하고 기존 중국 시장 내 오프라인 운영을 해 오던 에뛰드, 헤라, 이니스프리 등을 모두 철수 중 또는 철수 완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국 시장의 부진은 대외적 요소인 2017년 사드 사태 발 한한령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설명되지만, 더 깊은 내막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지 시장 트렌드에 발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K-콘텐츠의 인기에만 집중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이니스프리 매장 철수, 출처:서울경제
해당 칼럼을 읽으며, 다시 한번 해외 시장 공략에 있어 현지 마케팅도 브랜딩에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중 살아남은 설화수도 또 현재는 타국가 기업에 인수되었지만 색조 브랜드 3CE와 닥터자르트 등 K 뷰티 뿌리에서 시작하여 중국 시장 내 살아남은 브랜드의 공통점은 바로 확실한 브랜딩을 통한 현지 고객 마케팅이 있었습니다.
국내도 아닌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현지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현지화 마케팅 집중은 물론 브랜딩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중국 시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일본, 미국 또는 동남아 신흥 시장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 시간에도 현지 로컬 기업들은 현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트렌디한 마케팅으로 국내 기업들과 승부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고객사의 상황을 이해하고 움직이는 저희 지퓨처스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 관련 기사: [김남희의 차이나 트렌드] 설화수만 남기고 싹 접은 아모레…K뷰티 관심 없는 中, 뭘 쓰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