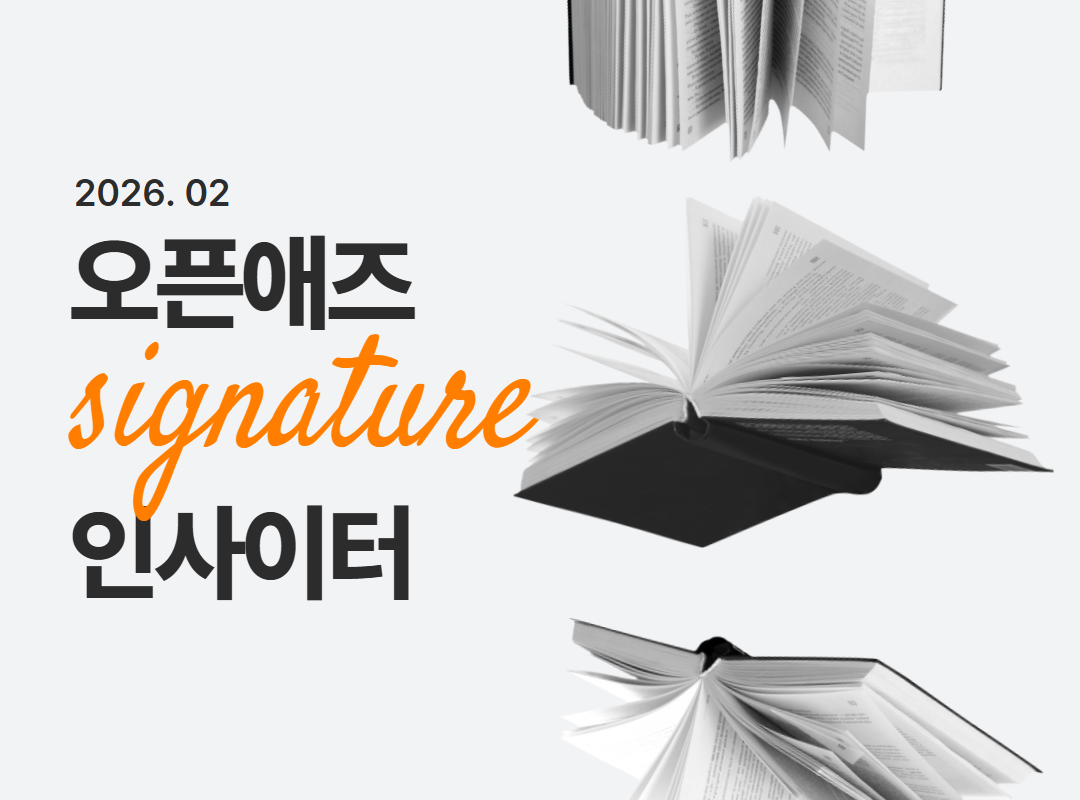사랑에 빠지는 순간🩷 예술가는 풍경으로 말한다
봄은 구름처럼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피어난다. 봄이 그 어떤 계절보다 설레는 이유는 사랑이 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만물이 약동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계절,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사랑을 꿈꾼다. 사랑은 봄을 타고 온다. 무채색 도시를 알록달록 물들이는 꽃잎처럼,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일으켜 산과 바다로 훌쩍 떠나는 소풍처럼,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사르르 녹게 하는 연인처럼. 사랑을 꼭 닮은 이 계절, 화가들은 그 간지러운 기운을 화폭에 고스란히 담는다.
사랑의 얼굴을 가진 그대
에드먼드 블레어 레이턴Edmund Blair Leighton, 1852~1922은 오늘날 전형적인 ‘중세 이미지’를 완성한 주역이다.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기사, 전장으로 떠나는 연인을 애틋하게 배웅하는 여인, 정교하게 수놓인 중세풍 드레스와 햇살 가득한 성의 풍경….
모두 레이턴이 만들어낸 장면이다. 레이턴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영국에서 활동한 역사주의 화가다. 하지만 ‘역사화’라는 명칭과 달리 실제 일어난 사건보다는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이상적 시대를 그렸다. 사실에 충실한 기록이 아니라 감정을 자극하는 서사에 집중했다. 그래서일까? 레이턴의 그림은 연극 무대처럼 극적이며, 멜로드라마의 클라이맥스 장면을 닮았다.
그중 ‘행운이 있기를’은 중세를 배경으로 한 그림으로 유난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대표작이다. 젊은 기사가 전장으로 떠나는 순간, 한 여인이 말 위에 올라탄 기사의 팔에 조심스레 붉은 리본을 묶어준다. 눈을 맞추지도, 손을 꼭 잡지도 못한 채 고요히 흐르는 이별의 풍경. 그 안에는 사랑, 슬픔, 자긍심, 불안 등 수많은 감정이 복잡하게 겹쳐 있다. ‘행운이 있기를’은 전투 장면도, 전쟁의 참상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저 떠나는 이와 남겨진 이의 짧은 만남이 전부다. 그 절제된 연출 속에서 감정은 오히려 더 깊이 퍼져나간다.

알로이스 칼보다Alois Kalvoda, 1875~1934는 체코의 근대 풍경화가다. 그는 특히 보헤미아 남부의 전원과 물가 풍경을 사랑했다. 봄이 오기 직전의 회갈색 들판, 안개가 걷힌 호숫가, 노을 질 무렵의 물비늘 같은 색감. 칼보다의 그림은 빛과 계절, 기온과 공기의 흐름까지 예민하게 포착해낸다. 그는 조용한 서정으로 풍경을 말한다.
대표작 ‘풀밭의 연인’은 제목 그대로 풀밭에 나란히 앉은 연인의 모습을 담은 걸작이다. 여기에서는 특별한 사건을 발견할 수 없고, 인물의 표정조차 또렷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다. 그저 초록빛으로 덮인 잔디밭 한가운데 둘만의 시간이 조용히 흐르고 있을 뿐이다. 연인을 둘러싼 자연은 마치 그들을 감싸안는 듯 부드럽고 따뜻하다. 낮은 언덕과 흩어진 들꽃, 흐릿한 하늘까지 모든 것이 조용한 공모자처럼 느껴진다. 칼보다 특유의 부드러운 붓 터치와 은은한 색감은 그림의 장면을 더욱 꿈결처럼 만든다.
칼보다는 이 작품으로 우리가 자연에서 누리는 친밀감을 이야기한다. 말없이 앉아 있는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 대신 가벼운 바람만이 흐른다. 화가에게 사랑이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저 햇살 좋은 날의 조용한 나눔이었는지도 모른다.

붓끝에 스민 가족의 사랑
메리 커샛Mary Cassatt, 1844~1926은 19세기 후반 인상주의가 한창 꽃피던 시기에 활동한 미국 화가다. 커샛은 여성의 시선으로 일상의 친밀한 순간들, 특히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를 섬세하게 그려냈다. 그 화풍의 정점은 대표작 ‘엄마와 아이’에 응축돼 있다.
이 그림에서 어머니와 어린아이는 나란히 앉아 있다. 이 평범한 장면 속에 수많은 감정의 결이 겹겹이 숨어 있다. 아이를 안고 다정하게 몸을 닦는 어머니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며, 아이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살포시 몸을 기대고 있다. 그 모습은 일상적이지만 친밀하고 따뜻하다. 커샛은 모성을 단순히 이상화하거나 미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육아의 노동, 인내, 정서적 연결감 같은 현실적 요소가 녹아 있다. 커샛 특유의 부드러운 색감은 그감정을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한다.
작가는 프랑스 인상주의 그룹과 함께 활동했지만, 주류 남성 화가들이 잘 다루지 않던 주제에 천착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다. 단순히 여성의 삶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가장 가까운 관계’의 본질을 섬세하게 포착했다. 세상에서 가장 사적인 연대이자,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사랑의 형태를 그린 그림이다.

‘광기의 화가’라 일컫는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 고흐 하면 흔히 강렬한 색채, 불안한 붓질, 감정의 폭발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그의 그림에는 그런 격정 이면에 아주 조용하고 다정한 순간들도 숨어 있다. 그 중 1890년에 그린 ‘첫걸음’은 프랑스 화가 장 프랑수아 밀레의 원작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고흐는 말년에 정신병원에 머무는 동안 밀레의 그림을 모사하면서 위안을 찾고, 정서를 다독이는 시간을 보냈다. 그중에서도 이 작품은 유달리 따뜻하고 조용한 감정을 내포한다. 이 그림에는 생애 첫걸음을 내딛는 아이가 등장한다. 흙먼지가 이는 농가 앞마당,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의 아버지가 두 팔 벌려 아이에게 손을 내민다. 어머니는 뒤에서 아이를 살짝 밀어주며 살포시 손을 뗀다.
단순하고 소박한 묘사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가장 위대한 순간을 담았다. 이 작품에는 역경과 괴로움보다는 가장 인간적인 감정, 즉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과 함께 나아가려는 몸짓이 있다. 아마 고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으리라.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외롭더라도, 세상을 향해 첫걸음을 떼는 아이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다시 걸어갈 수 있다고.

빛과 색으로 그린 우정의 순간
에두아르 마네Édouard Manet, 1832~1883의 ‘자신의 아틀리에에 있는 클로드 모네’는 한낮의 햇살이 내려앉은 강 위에서 동료가 그림 그리는 장면을 담은 작품이다. 여기에는 두 화가 사이의 묘한 긴장감, 인상주의라는 시대의 새 물결이 조용히 흐르고 있다.

이 그림에서 모네는 일명 스튜디오 보트에 앉아 있다. 실제로 모네는 작은 배를 아틀리에 처럼 꾸미고 센강을 유영했는데, 마네가 그 장면을 마치 스냅사진처럼 즉흥적으로 포착했다. 모네 앞에는 그의 아내 카미유도 함께 있다. 센강 풍경을 바라보는 화가, 그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여인, 모든 장면을 삼인칭으로 조망하는 또 다른 화가…. 복잡하게 얽힌 시선의 구조가 작품을 하나의 중첩된 프레임으로 만든다. 화면을 가득 채운 부드러운 색감과 물 위에 반사되는 빛, 그리고 센강의 한적한 풍경은 마네가 평소보다 한층 여유롭고 느긋한 감정으로 붓을 들었다는 걸 보여준다.
그의 다른 작품에서 드러나는 날카로운 리얼리즘 기법과 비교해 훨씬 따뜻하고 관조적인 시선이 느껴진다. 마네가 오랜 친구를 바라보는 태도이자, 한 화가가 또 다른 화가의 세계를 담아낸 순간이다. 모네는 풍경을 그리고, 마네는 모네를 그린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둘을 바라본다. 이 연결망에서 회화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예술적 관계의 거울이 된다.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 Auguste Renoir, 1841~1919의 ‘보트 파티의 점심 식사’는 시대의 공기를 고스란히 담아 냈다. 1880년대 파리, 센강의 작은 레스토랑 테라스, 점심을 즐기기 위해 모인 친구들, 평화로운 햇살과 바람, 잔잔한 대화와 웃음소리까지. 이 그림은 인상주의가 가장 사랑했던 빛과 일상, 인간관계의 생생한 교차점을 한 장면으로 응축해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인물은 모두 르누아르의 실제 친구들이다.
작품의 왼쪽 화면 전경에서 강아지를 안고 있는 여인은 그가 사랑한 연인이자 모델인 알린 샤리고로, 훗날 르누아르의 아내가 된다. 이 외에도 테이블 주위를 둘러싼 인물은 모두 당대의 배우, 문학가, 화가들이다. 즉 르누아르가 살아간 공동체의 풍경이다. ‘보트 파티의 점심 식사’는 인상주의 양식과 정신을 가장 풍요롭게 구현한 작품으로 꼽힌다. 즉흥적인 붓 터치, 자연광의 변화, 찰나의 순간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치 그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이 된 듯한 기분이 든다. 우리는 그저 가만히 그들의 웃음과 행복한 분위기를 구경할 수 있다. 그러다 문득 깨닫는다. 인상주의가 추구한 가치가 바로 이거였다고. 살아 있음에 대한 감사, 흘러가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붙잡는 일.
르누아르에게 회화는 삶의 축제였다. 화려하지 않지만 풍요롭고, 과장하지 않지만 감동이 충만한 축제. 그림 속 인물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생기와 그날 오후의 햇살은 여전히 화면에 끝없이 흐르고 있다.
글. 이현(<아트인컬처> 부편집장)